쌍용차, 법정관리 탈출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쌍용자동차는 10여 년 전인 2009년 대규모 해고 사태로 노사분규 악몽을 겪었다. 이후 해고자들은 간신히 복직을 했지만 또다시 쌍용자동차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생사기로에 서게 되면서 임직원 5천여 명을 포함해 협력업체 등 2만여 명의 일자리가 다시 위협받게 됐다. 12년만의 일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월부터 제대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한 채 휴업을 반복했다. 자금난에 따른 협력사의 부품납품 거부에 이어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부품 공급업체들도 대부분 조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면서 벼랑 끝에서 버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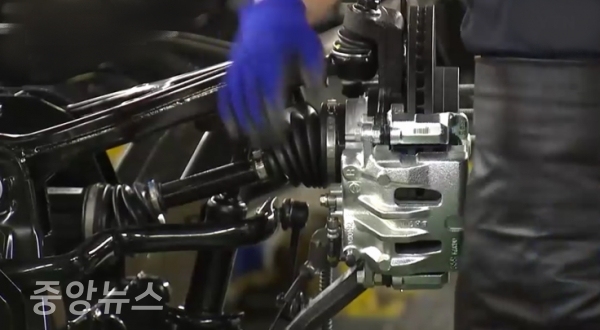
협력업체 비상대책위도 뒤늦게 법정관리가 시작되자 정상 조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쌍용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작된 법원의 회생 절차가 성공을 거두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유력한 새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쌍용차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 규모가 3700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고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쌍용차가 파산이 되어 2만명의 실업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5년차에 접아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쌍용자동차가 파산이 아닌 존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더욱이 국내 자동차 시장 구조가 현대자동차·기아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다는 점도 쌍용차를 회생시켜야 할 이유라는 것,
쌍용차도 법정관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잠재 투자자였던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와의 협의가 지연되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다수를 대상으로 인수합병(M&A)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 투자자의 투자 계획을 회생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쌍용차를 인수할 의향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을 보인 업체는 모두 6∼7개 업체다.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모터스와 전기차 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을 포함한 몆몆 업체다. 하지만 문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의 자금력과 경영 능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쌍용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다.
인수에 나설 기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쌍용자동차가 유력한 투자자를 확보하고 채권단의 회생계획 동의를 구하려면 기업의 존속가치를 크게 높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훈수했다. 이어 2009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당시 전체 임직원의 36%인 2600여명이 정리해고되면서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일어났던 때를 기억하라며 쌍용자동차가 또다시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과 비용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근로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월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군살빼기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때가 바로 노사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쌍용차는 2009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뒤 인도 마힌드라가 인수하면서 간신히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주주가 대규모 신규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쌍용차는 신차 개발 등에 뒤져 다시 경영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져 10여 년 만에 판박이 위기를 겪게 됐다.

